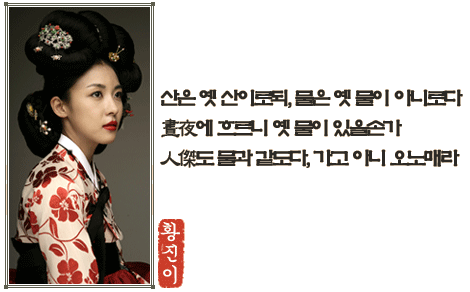이용우 칼럼 (부동산캐나다 사장, 편집인)
산은 옛 산이로되
-그리운 사람 간 곳 없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옛 고향집과 부모 형제, 그리고 옛 친구가 아닌가 한다. 다음은 내가 20년 전 캐나다로 이민 와서 처음 만난 옛 친구의 이야기로 십수년여 전에 쓴 글이다. 그의 사는 모습이 무척 독특해서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0…우리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처음 그 친구를 만난 것은 2000년 늦가을녘, 한 교민신문에 내 글이 실리고 나서였다. 나는 당시 이민 온지 3개월 밖에 안 돼 이것저것 할 일을 찾고 있을 때였다. 그는 신문에서 내 글을 보았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이 넓은 땅에서 나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는 투박한 경상도 억양으로 대뜸 자기네 가게(집)으로 놀러오라고 했다.
그 친구와 나는 같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병과(兵科)가 서로 달라 함께 근무한 적은 없었다. 입대 동기로 훈련시절 동고동락한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그가 누군지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았던 터다. 아무튼 우리는 먼 타국에서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들떴다.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윈저 조금 못 미쳐 있는 인구800여 명의 작은 시골도시(St. Joachim)였다. 그는 거기서 아내와 두 딸과 살며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거무스레한 얼굴에 다부진 체격 등 누가 봐도 그는 첫눈에 해병대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 그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0…공대 기계과 출신으로 한국의 대기업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설계했던 그는 손재주가 좋아 웬만한 기계는 다 다뤘다. 무척 오래된 가게와 집이 달린 건물을 사서 스스로 수리를 했다. 그것(손재주)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에 친구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났다.
그는 성격이 좀 괴팍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신세지기를 싫어했고 특히 한국인과 어울리는 것도 달갑잖아 했다. 바닷가 출신(진해)으로 낚시광인 그가 외진 시골에 터를 잡은 것은 집 뒤에 조그만 샛강이 흘러 낚시하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존심도 무척 강해 내가 “나 같은 문(文)돌이는 손재주가 없어 이런 오래된 집에 못 산다. 너 같은 공(工)돌이나 살 수 있다”고 농담했더니 대번에 안색이 변하며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을 거다. 앞으로 그런 말 조심해라”며 정색했다. 여름에 동네 손님이 웃통을 벗고 가게에 들어오면 쫓아버렸고 강도짓하는 청년을 붙잡아 일장훈시 후 돌려보내기도 했다.
0…그러나 그에게는 섬세하고 여린 면도 많았다. 외로움도 많이 탔다. 한번은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취기가 돌자 가수 장욱조의 ‘고목나무’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옛 사람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은/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그때 노래가사와 밤 풍경이 그처럼 맞아떨어질 수가 없었다. 고독이 사무치는 노래를 듣자니 콧잔등이 시큰했다.
진해에서 함께 자란 그의 아내 역시 좀 유달랐다. 건강과 자연생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유기농 채소를 가꾸고 낚시용 지렁이도 길렀다. 허름한 곳간에 나무상자를 놓고 지렁이 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녀 역시 한국인과 휩쓸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처럼 유별난 부부가 우리 가족만은 어느 때나 가도 좋아했으니 수수께끼다. 매번 갈 때마다 농사지은 거라며 콩과 감자 등을 한 자루씩 안겨주었다. 어느 봄날, 집 뒤에 흐르는 실개천에 카누를 띄워놓고 뱃놀이 하던 추억이 삼삼하다.
0…그러던 친구가 어느날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홀연히 밴쿠버로 떠나겠다고 전해왔다. 온가족이 밴에다 이삿짐을 매달고 보름여에 걸쳐 대륙을 횡단했다. 친구는 거기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럭저럭 잘 정착하는 듯했다. 우리 보고 놀러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소식이 뜸해지더니 언젠가부터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나와 아내는 그들이 평소 고향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아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엊그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우리는 또 한번 놀랐다. 그들은 알버타 에드먼튼에서도 한참 북쪽으로 올라간 두메산골 마을에서 숯 굽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껏 연락을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후 알리려고 그랬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세상에, 산촌에서 무슨 숯을 굽는다고?
0…나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구름처럼 살다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협객(俠客)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나로선 도저히 엄두도 못낼 일을 망설임 없이 해내는 그의 용기가 부럽다. 눈앞의 걱정이나 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 후로 친구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두 딸이 에드먼튼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지금도 캐나다에 사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하다. 아무쪼록 친구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주야(晝夜)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소냐./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 –황진이